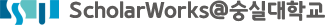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태종 조 樂調에 반영된 唐․俗樂 악장의 양상과 중세적 의미Aspects and Meaning of Tang · Folk Music Akjangs Reflected in King Taejong Jo’s Akjo(樂調)
- Other Titles
- Aspects and Meaning of Tang · Folk Music Akjangs Reflected in King Taejong Jo’s Akjo(樂調)
- Authors
- 조규익
- Issue Date
- Jul-2017
- Publisher
- 우리문학회
- Keywords
- 악조(樂調); 악장; 고려 당악정재; 고려 속악정재; 송도(頌禱); 선어(仙語); 수보록(受寶籙); 금척(金尺); 동동(動動); 정읍사(井邑詞); Akjo(樂調); Akjang(樂章); Goryeo Tang Music Jeongjae(高麗唐樂呈才); Goryeo Folk Music Jeongjae(高麗俗樂呈才); Seoneo(仙語); Suborok(受寶籙); Geumcheok (金尺); Songdo(頌禱); Dongdong(動動); Jeong-eup(井邑)
- Citation
- 우리문학연구, no.55, pp.163 - 200
- Journal Title
- 우리문학연구
- Number
- 55
- Start Page
- 163
- End Page
- 200
- ISSN
- 1229-7429
- Abstract
-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賓禮라 할 수 있는 태종조의 사신연이나 종친형제연 등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정재가 공연되었다. 고려 당악정재 5종 중 오양선․연화대․포구락 등 3종, 속악정재 3종 중 아박․무고 등 두 가지가 이들 의례에서 사용되었다. 각각의 정재들에는 언어적 메시지라 할 수 있는 악장들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고려 당악정재에 속하는 것들은 <碧烟籠曉詞>․<縹緲三山詞>(이상 오양선), <微臣詞>․<日暖風和詞>․<閬苑人閒詞>(이상 연화대), <三臺詞>․<洞天景色詞>․<兩行花竅詞>․<滿庭羅綺詞>(이상 포구락) 등 9편의 악장들과 고려 속악정재에 속하는 <動動>(아박 정재)․<井邑詞>(무고 정재) 등 두 편의 악장들이고, 조선조 창작 당악정재에 속하는 것들은 <受寶籙>(수보록 정재), <金尺詞>․<君王萬壽>(금척 정재) 등 세 편이다. 고려의 속악정재들은 형식이나 절차, 주제의식의 면에서 고려 당악정재들을 본뜬 것들이다. 특히 속악정재 아박의 악장인 <동동>은 ‘송도의 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仙語’를 본떴다고 했다. 고려 당악정재의 舞妓들은 서왕모 등 신선으로 등장하여 임금에게 不老長壽를 헌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그들이 구사하던 말이 선어이고, 그 말들을 송도로 엮어낸 것이 당악정재 악장들의 문법이다. 이처럼 고려 당악정재 악장들의 경우 임금에 대한 조건 없는 송도로 일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보록>이나 <금척> 등 조선조 창작 당악정재들의 경우는 ‘천명에 의한 조선의 건국과 왕조영속의 당위성 과시’라는 분명한 현실인식과 목표를 주제의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왜 임금이 오래 살아야 하며, 왜 왕조는 영속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답을 작품에 드러내고자 한 것은 예악국가의 중세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해 임금의 능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건국에 원용된 논리는 주나라의 천명사상이었고, 敬天․保民․明德은 그 핵심이었다. 창업주가 천명을 받은 것과 그를 도울 유능한 신하들이 있다는 것은 왕조 영속의 절대적 조건들이었다. 그런 조건들을 갖춘 임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선정을 베푸는 임금의 장수를 축원하는 것은 臣民들의 자연스러운 소망일 수밖에 없었다. <수보록>의 ‘奠于新都 傳祚八百’이나 <금척사>의 ‘傳子及孫 彌于千億’은 창업주가 받은 천명을 전제로 왕조의 영속을 단언한 예언들이다. ‘이성계가 천명을 받아 새 왕조를 개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면 자자손손 무궁하게 이어지리라’는 예언 즉 ‘천명으로 개국한 왕조가 무궁하게 이어짐’은 천명론을 통해 이들이 발견한 논리적 귀결이었고, 악장을 통해 반복․주입시키고자 한 정치적 표어이기도 했다. 아박정재 악장 <동동>의 경우 그 문법 자체가 당악정재들의 ‘선어’를 본뜬 것인 만큼 주제의식 또한 고려당악들이 표상하던 ‘임금에 대한 송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속악을 정비해가던 당시 속악정재나 악장은 이미 체제가 확립되어 있던 당악정재 및 그 가사들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악정재와 속악정재가 ‘임금에 대한 축수’라는 동기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두 악장들은 표현문법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속악정재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던 무고의 악장 <정읍사>는 악조에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다. 중종 조에 이르러 <정읍사>는 ‘淫詞’의 판정을 받아 효자의 노래 <오관산>으로 대체되었지만, 적어도 악조가 완성된 태종 조까지는 그것이 ‘행상 나간 남편에 대한 부인의 걱정’을 그려냄으로써 유교의 ‘㤠 윤리’에 충실한 노래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신들을 위한 잔치자리에서 속악정재 무고와 그 악장 <정읍사>를 통해 중세왕조 조선의 이념적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 Cho, Kyu Ick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otal Views & Downloads
- STATISTICS
- Total View :0
- Today View :0
Soongsil University Librar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02-820-0733
COPYRIGHT ⓒ SOONGSI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