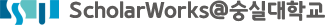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결혼이주여성 제재 소설의 문화변용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Classifying novels about marriage im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 aspects of acculturation
- Other Titles
- Classifying novels about marriage im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 aspects of acculturation
- Authors
- 이경재
- Issue Date
- Aug-2015
- Publisher
- 한국현대문학회
- Keywords
- 결혼이주여성; 문화변용; 주변화; 동화; 분리; 통합; marriage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marginalization; assimilation; segregation; integration
- Citation
- 한국현대문학연구, no.46, pp.413 - 441
- Journal Title
- 한국현대문학연구
- Number
- 46
- Start Page
- 413
- End Page
- 441
- ISSN
- 1229-2052
- Abstract
- 지금까지 소설속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이 타자화되는 방식이나 반대로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와 관계 맺는 양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베리(Berry)의 문화변용(acculturation) 모델을 바탕으로 분류작업을 시도하였다.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이순원의 「미안해요, 호 아저씨」에는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남아 여성으로 확대된 결혼이주의 역사와 그 배경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한수영의 「그녀의 나무 핑궈리」, 백가흠의 「쁘이거나 쯔이거나」, 정인의 「그 여자가 사는 곳」과 「타인과의 시간」에 등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심각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린다. 그 결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한 채 주변화(Marginalization)된다. 그 결과 그들은 죽거나 죽이거나 혹은 한국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지만,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혼이주여성을 우리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만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서성란의 「파프리카」와 이시백의 「개값」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대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한다. 송은일의 『사랑을 묻다』와 정지아의 「핏줄」은 한국 사회로의 동화(Assimilation)와 그 어려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은 빠른 시간 내에 이주 여성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와 관련한 이주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한국인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동화시키려는 욕망도 결혼이주여성이 동화되려는 욕망도 뜨겁지만, 가부장적 혈통주의(『사랑을 묻다』)와 인종의 벽(「핏줄」)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리(Segregation)의 시도가 드러난다. 조선족 림해화는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자 두 번(결혼과 취업)이나 시도를 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실패한 이후에는 조선족만의 공동체로 돌아와 한국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분리의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김재영의 「꽃가마배」,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한지수의 「열대야에서 온 무지개」는 다문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인 통합(Integration)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소설들이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의 모습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을 돌보는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하는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와 「열대야에서 온 무지개」는 모국문화의 유지와 주류문화에의 적응이라는 통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게 한 조건으로는, 가부장적 혈연주의의 약화, 매매혼이 아닌 사랑에 바탕한 결혼, 정부와 사회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류는 문화변용 모델에 따른 것일 뿐, 개별 작품에 대한 문학적 가치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 Lee, Kyung Jae
- College of Humanitie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 STATISTICS
- Total View :8,182,707
- Today View :9,788
Soongsil University Librar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02-820-0733
COPYRIGHT ⓒ SOONGSI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